이달의 독립운동가
조국의 독립에 앞장선
몽골의 슈바이처

글 학예실 / 그림 얌스
조국의 독립에 앞장선
몽골의 슈바이처
이태준(李泰俊, 1883. 11. 21 ~ 1921. 2)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광복회와 공동으로 이태준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경남 함안에서 출생한 이태준은 1907년 10월 1일 세브란스의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안창호를 만나
신민회의 자매단체이자 비밀청년단체인 청년학우회(靑年學友會)에 가입하면서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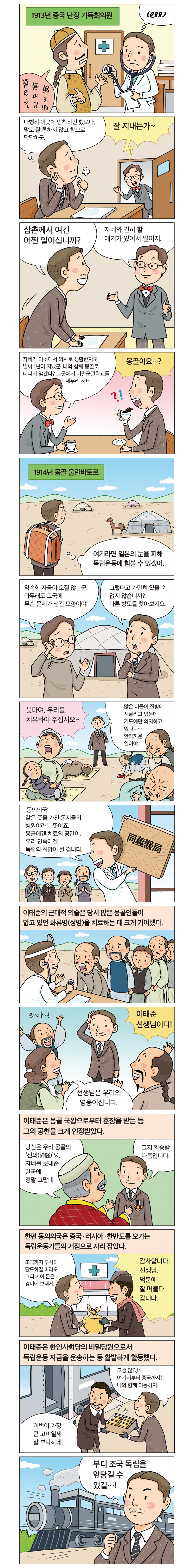
중국으로의 망명
1911년 말 일제는 이른바 ‘105인 사건’을 조작하여 독립운동가들을 대대적으로 검거하였다. 이태준의 친구이자 스승인 김필순이 연루되어 피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두 사람은 중국 망명을 계획했다. 1911년 12월 31일 김필순을 먼저 기차에 태워 떠나보내고 이태준은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미 자신과 김필순의 중국 망명 계획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있었다. 그는 즉시 평양행 기차를 타고 부랴부랴 중국 망명길에 올랐다.국내 탈출에 성공한 이태준은 중국 난징(南京)에 도착했으나, 여비가 끊어진 데다 언어장벽으로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다행히 중국인 기독교도의 도움으로 기독회의원(基督會醫院)에 의사로 취직했다. 그러나 그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아주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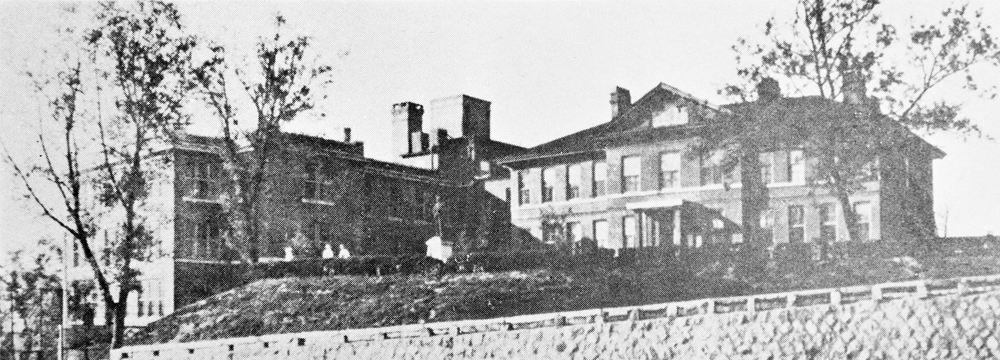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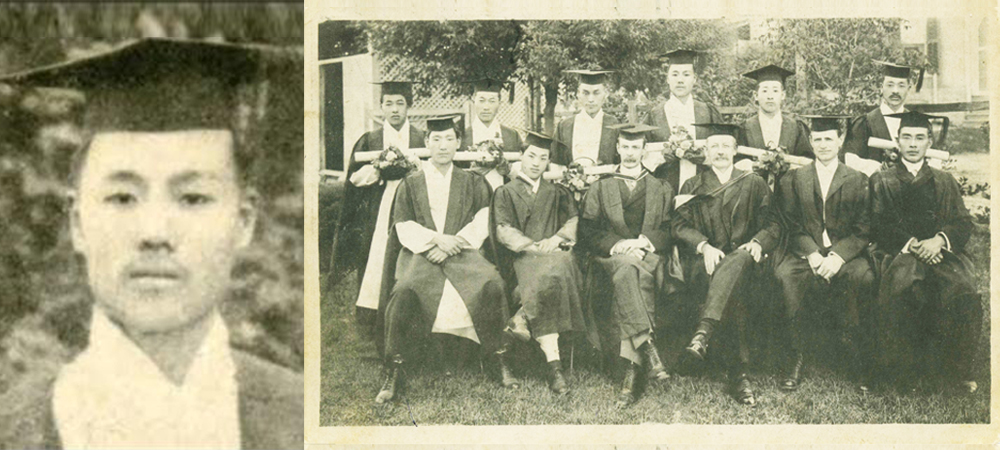
(왼쪽부터) 이태준 / 이태준을 포함한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뒷줄 왼쪽 네 번째)
몽골 이주와 항일혁명 활동
1914년 이태준은 비밀군관학교를 설립한다는 김규식을 따라 몽골로 떠났다. 고륜(庫倫,현 울란바토르)에 도착해 한국에서 약속한 자금을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았다. 이에 김규식은 서양인을 대상으로 가죽 판매 사업을 시작했고, 이태준은 병원 동의의국(同義醫局)을 개업했다.당시 병에 걸리면 기도를 드리고 주문을 외우는 등 미신에 의존한 치료법만을 알고 있던 몽골인들 사이에서 근대적 의술은 큰 인기를 얻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감염되어 있던 성병인 화류병(花柳病)을 근절시키자, 몽골인들은 ‘까우리(高麗)의사’로 부르던 이태준을 ‘신인(神人)’ 또는 ‘여래불(如來佛)’처럼 여겼다. 1919년 7월 몽골국왕 보그드 칸(Bogd Khan)은 그 공로를 인정하여 제1등급에 해당하는 국가훈장을 수여하였다. 몽골에서 두터운 신뢰를 쌓은 이태준은 중국 장가구(張家口)와 고륜 사이를 오가는 독립운동가들에게 숙식과 교통을 비롯한 편의를 제공했다. 신한청년당 대표로 파리강화회의에 파견되는 김규식에게는 2천 원의 운동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1920년 이태준은 한인사회당의 비밀당원으로 소비에트정부가 대한민국임시정부에게 지원한 40만 루블 상당의 금괴 중 12만 루블을 상하이로 운송하게 되었다. 김립이 갖고 온 자금이 고륜에 도착하자, 이를 김립 8만 루블·이태준 4만 루블로 나누어 차례로 운송하기로 했다. 1차분 8만 루블은 이태준의 도움으로 고륜-장가구-베이징을 거쳐 1920년 상하이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다. 이태준은 베이징에서 김원봉을 만나 의열단에 가입, 당시 의열단에게 절실했던 폭탄제조자 마쟈르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고륜으로 돌아가 남은 4만 루블을 운송하고자 했다. 그러나 러시아 백위파 운게른 부대를 피해 은밀하게 이동하던 중 발각되고 말았다. 고륜으로 압송되어 가택연금에 처해진 그는 결국 총살되어 순국했다. 그의 나이 불과 38세였다. 정부는 1990년 고인의 활동을 기리어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에 추서하였다.

몽골 울란바토르에 건립된 이태준 기념공원(국가보훈처 제공)

이태준 기념공원 내 이태준 기념관(국가보훈처 제공)

이태준의 몽골 국가훈장 수여 내용이 실린 『독립신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