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독립운동가
죽음으로 절조(節操)를 지킨 선비
이근주

글 학예실
죽음으로 절조(節操)를 지킨 선비
이근주(李根周, 1860.2.3. ~ 1910.9.23.)
독립기념관은 국가보훈처·광복회와 공동으로 이근주를 11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그는 왜적, 매국 무리들과 한 하늘 아래 삶을 사는 것을 거부하겠노라며 죽음을 통해 절조를 지킨 선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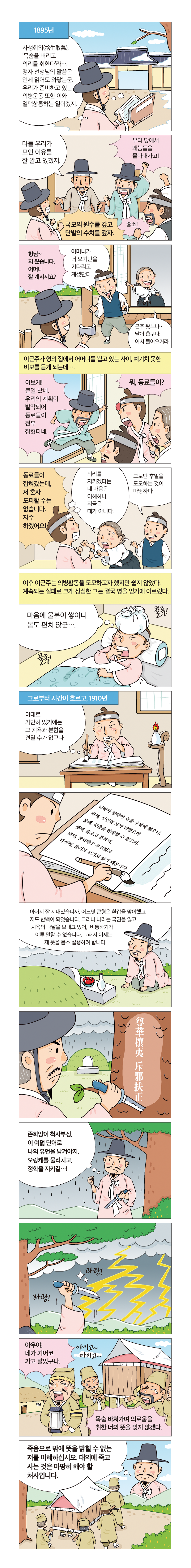
의병을 일으키다
이근주는 1860년 2월 충청남도 홍성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이근주는 분개하며 홍주 목사 이승우에게 의병을 일으킬 것을 권하였다. 김복한, 안병찬 등 지역의 유생들과 연합하여 홍주성 내 창의소를 설치하고 의병을 규합하였다. 그러나 창의소를 설치한 다음날인 1985년 12월 4일(음) 이승우가 배반하여 김복한 등 주요 인물들이 붙잡혀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근주는 어머니를 만나러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화를 면하였지만, 홀로 무사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자수를 결심하였다. 그러나 노모와 형이 ‘자수는 훗날을 도모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만류하자 뜻을 꺾었다. 이후 1896년 청양 일대에서 전(前) 수군절도사 조의현과 함께 의병을 일으키기로 하였으나 조의현마저 붙잡히게 되어 의병을 일으키려는 그의 뜻은 끝내 좌절되었다.

이근주 초상화(국가보훈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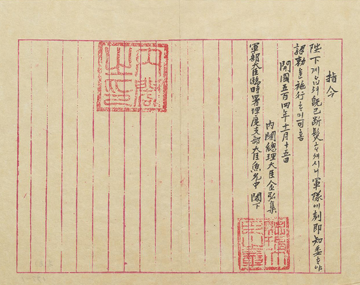
단발령 지령
항일사적을 편찬하다
의병을 일으키려는 뜻은 좌절되었으나 이근주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제국주의 침략 과정과 나라 잃음의 설움을 많은 글 속에 담아냈다. 1895년 홍주의병의 과정을 기록한 『을미록』, 나라가 매국의 무리에 의해 더럽혀짐을 한탄한 『절의가』, 장부인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탄만 하고 있음을 적은 『신년탄사』 등이 있다. 이외에도 을사늑약에 항거하여 자결한 민영환과 이설에 대한 애도시 등을 남겼다.

일제에 국권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통곡하는 사람들(1910년 8월 29일)

신년탄사(1910년, 이강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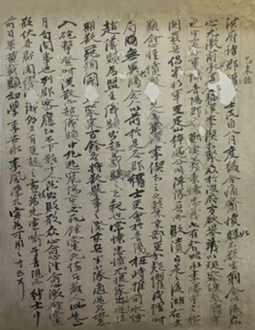
을미록(1895년, 이강세 제공)
목숨을 버리고 의를 따르다
1910년 8월 강제병탄이 되자 자결로 일제의 침략에 항거하기로 결심한 이근주는 1910년 『태일자문답약초(泰一子問答略抄)』에서 ‘슬프고 분하며,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음을 전하였다. 이후 아버지의 묘소 앞 나무에 사학을 배척하고 정학을 지킨다는 뜻의 ‘존화양이 척사부정(尊華攘夷 斥邪扶正)’의 유언을 새기고 1910년 9월 자결하였다.
이근주의 자결은 평소 삶의 자세로 삼았던 맹자의 ‘사생취의(捨生取義)’ 즉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한 것이었다. 이근주와 함께 의병을 규합했던 김복한은 의로움을 취했으며 인을 이루었다고 그의 공적을 기렸다. 그의 죽음은 개인의 희생에 그치지 않고 후학들에게 나라사랑정신을 고취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정부는 이근주의 공적을 기리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근주 부친의 묘(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이강세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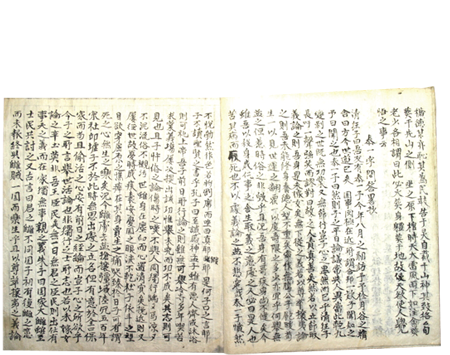
태일자문답약초(이강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