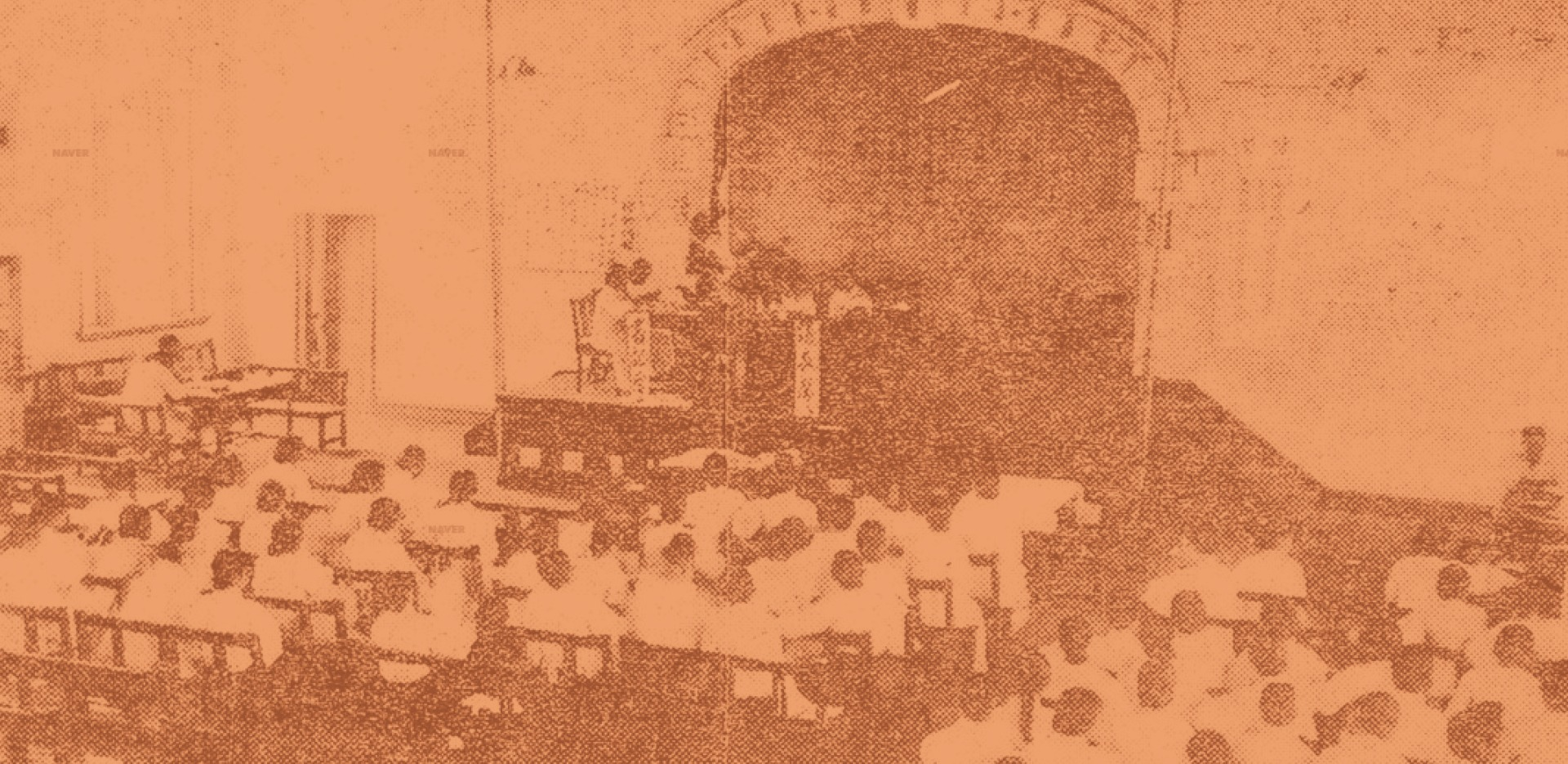
남산여관 주인 정순희와
가족들이 선택한
‘방향’을 가슴에 담다
글 독립기념관 독립운동가 자료발굴TF팀
독립기념관은 2018년부터 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국가보훈부에 유공자로 포상 추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관심을 담은 것이다.
2023년 매월 독립기념관이 발굴한 독립운동가를 소개한다.
‘방법’은 달라도 ‘방향’은 하나다 - 근우회에서 활동하다
1927년 2월,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고자 신간회를 결성했다. 두 계열은 여성운동에서도 뜻을 함께하여 같은 해 5월 27일에 식민지 시기 최대 여성단체인 근우회를 조직했다. 근우회는 봉건적인 사회로부터 여성을 해방하고 일제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다. 근우회는 전국에 지회를 두었는데,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해 지회의 자치활동을 보고받고 활동 내용을 정비했다. 1929년 7월 3일 근우회 전국대회준비위원회가 열리자 경성지회 소속으로서 각 지회에서 찾아오는 회원을 맞이하는 ‘접대부(接待部)’에서 활동한 인물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정순희(鄭順姬)였다.
정순희의 근우회 활동은 1930년이 되면서 더욱 활발해졌다. 경성지회가 1월 15일부터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기로 계획하자 이를 담당했고, 이어 2월 19일 전국대회준비위원으로서 경성지회 모임에 참석했다. 3월 17일 집행위원회에서는 조사부 소속으로 편입되어 활동했다. 근우회는 지회를 늘리는 것에 힘썼는데, 4월 15일에 ‘경동(京東)지회’ 신설을 논의하는 회의에 본부 회원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6월 2일 경성지회 집행위원회에서 선전조직부장의 중책을 맡았다. 정순희는 이듬해에도 경성지회의 주요 인사로 활약했으며 지속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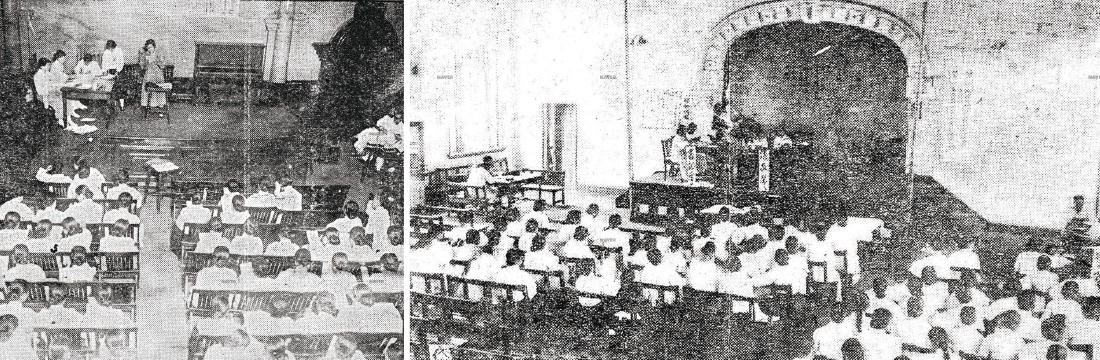
근우회 창립총회 『조선일보』 (1927.5.29.)(좌), 근우회 전국대회 『조선일보』 (1929.7.28.)(우)
광주학생운동, 나와 근우회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1929년 10월 30일, 광주중학교 3학년 일본인 후쿠다 슈조(福田修三) 등 광주여자고등보통학교 3학년인 박기옥(朴奇玉)을 희롱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촌동생이자 광주고등보통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박준채(朴準埰)가 이 광경을 목격하고 항의했다. 사태는 일본인 학생들과 조선인 학생들의 충돌로 확대되었다. 경찰이 개입했으나 일본인 학생들을 두둔하며 오히려 조선인 학생들을 구타했다. 이로 인해 11월 3일, 광주 내 여러 학교에서 시위가 발생했고 중등학교에 휴교령이 내려졌다. 이것이 광주학생운동의 시작이었다. 이날 하루에만 시위에 참여했던 조선인 학생 수십 명이 구금되었다.
이 소식은 서울까지 전해졌고 경신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휘문고등보통학교, 협성실업학교 등이 12월 9일부터 이에 호응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정순희를 비롯한 근우회 회원들은 1929년 12월 9일에 종로 공평동에서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들은 “여성운동을 자부하는 근우회로서 움직이지 않으면 욕을 먹을 것이다.” 또는 “근우회는 냉정하게 사건의 추이를 방관하는 것이 유리한 계책이다.”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을 논의했다. 결국 여학생들의 시위는 근우회에서 주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나, 정순희와 함께 본부 위원으로 활동했던 허정숙(許貞淑, 이명 許貞子), 한신광(韓晨光) 등 주요 인사들이 대거 피체되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시위는 계속되었고 정순희의 딸 이순옥(李順玉) 역시 이와 관련된 활동을 준비하다가 징역 7개월을 받았다.

정순희의 딸 이순옥
여관 운영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하다
정순희는 1920년대에 종로 적선동에서 하숙집을, 1929년경에 종로 인사동으로 이사하여 남산여관을 운영했다. 정순희가 언제, 무슨 이유로 고향인 함북 경성을 떠나 서울에 와서 하숙을 시작했는지, 또 무슨 이유로 이사했는지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그가 운영했던 하숙집과 여관은 여느 평범한 숙박시설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신문기사에는 정순희의 하숙집과 여관에 관한 기사가 상당수 발견된다. 1925년 10월 형사들이 그의 하숙집을 수색하여 총기를 소지한 청년을 체포하였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체포된 인물은 3·1운동에 참여한 전력이 있는 이종칠(李鍾七)이라고 하는데, 그가 왜 총기를 소지하고 정순희의 하숙집에 숨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정순희가 운영했던 남산여관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 1929년 11월 의열단원 서응호(徐應浩), 윤충식(尹忠植), 김철호(金哲鎬) 등이 체포되었다. 그들은 당시 경성에서 개최된 조선박람회를 계기로 모종의 거사를 계획하였는데, 거점 장소로 활용된 곳이 바로 남산여관이었다. 또한 수감되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옥고를 치른 후 남산여관에 묵었던 기사도 다수 발견된다. 유남수(柳湳秀)는 경기도 이천 출신으로 조선일보 이천지국 기자였다. 죽마고우인 이수흥(李壽興)은 참의부원으로 1926년 5월에 요인 암살, 군자금 모집을 위해 국내에 잠입했다. 이때 유남수는 이수흥과 형인 유택수(柳澤秀)를 돕던 중, 1926년 11월에 함께 체포되었다. 유택수와 이수흥은 교수형에 처해졌고 유남수는 징역 2년을 받았으나 감형되어 1929년 5월 28일에 출옥했다. 이때, 몸을 추스르기 위해 남산여관에 머무른 사실이 확인된다. 그뿐만 아니라 남산여관은 신간회, 근우회 모임에 참석한 각지 대표들의 숙소로 활용되기도 했다.
1929년 7월과 이듬해 12월 근우회 전국대회와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렸고, 1931년 5월에는 신간회 전국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때, 지방에서 상경한 대표들이 이곳에 숙박했다. 이를 비롯해 1929년부터 1933년까지 남산여관을 이용했던 독립운동가는 최소 수백 명 이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정순희가 운영했던 하숙집과 남산여관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거점이자, 휴식처였던 것이다.하지만 남산여관은 1933년부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당시 조선공산당재건협의회 사건으로 수배되었던 윤병권(尹炳權)을 남산여관에 숨겨주다 발각되어 정순희는 1932년 10월 29일에 검사국으로 송치되었고, 서대문형무소에서 6개월을 복역하다가 이듬해 7월 23일에 출옥했다. 이후, 남산여관은 독립운동을 논의하거나 출옥한 독립운동가들의 거점으로 활용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격렬한 민족주의자’가 선택한 독립운동으로 더욱 강인해지는 길
정순희의 가족들은 독립운동을 함께 한 동료이기도 했다. 남편인 이정수(李正洙)는 1920년에 러시아 연해주에서 한인사회당 간부로 활동했고, 1924년에는 조선노동당을 창립했던 핵심 인물로 1926년에 2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옥고를 겪었다. 딸 이순옥은 이화여자전문학교 재학 중 중앙청년동맹에 가입하고, 광주학생운동으로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준비하다 징역 7월(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당시 경찰신문조서를 살펴보면, 어머니 정순희를 ‘격렬한 민족주의자’로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본인이 사회운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조선의 사회운동자들이 우리 집에 많이 출입하여 자연스럽게 사회운동에 흥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이순옥의 활동은 어머니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순옥은 1930년 3월 22일부터 옥고를 치렀으나 공소권을 포기하면서 24일에 출옥했다. 출옥한 이후, 이순옥은 어머니 정순희와 함께 근우회 경성지회에서 활동했고, 중앙청년동맹 집행위원, 대의원으로도 활약했다.
한편, 정순희가 서대문형무소에서 출옥한 이후에 어떤 활동을 했으며 언제 사망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지내온 시간과 활동을 돌아보며 기꺼이 독립운동을 선택했던 그와 가족들의 삶과 자세에 대해 곱씹어 보고자 한다. 1929년 2월 16일, 남편인 이정수가 37세의 나이로 사망했다. 딸이자 동료인 이순옥은 광주학생운동 동조 시위에 참여했다가 1930년 1월에 체포되었다. 하지만 정순희는 독립운동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배우자를 떠나보내고 자식마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련에 굴복하여 약해지기보다 한 사람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더욱 강인해지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 모습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말보다 강한 울림을 주고,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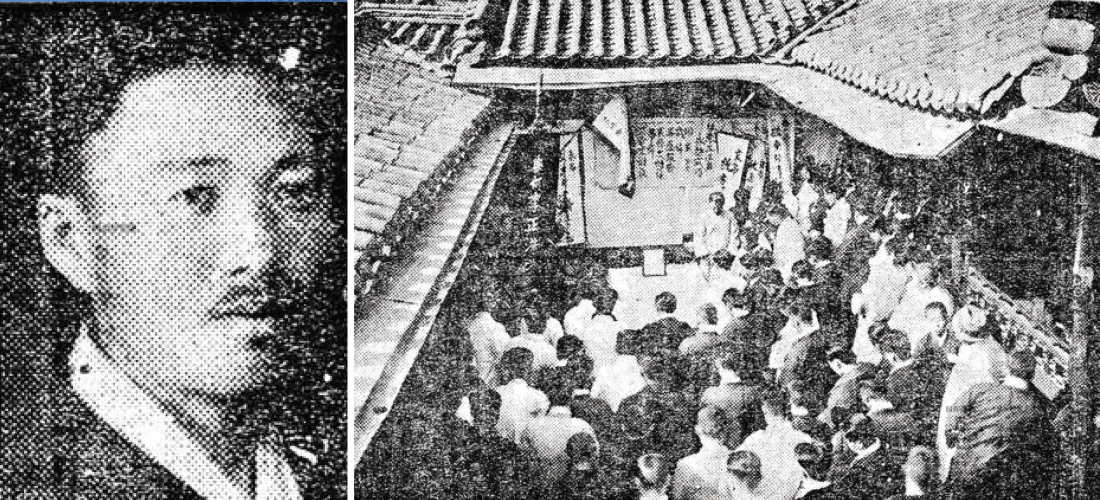
정순희의 남편 이정수 『조선일보』 (1929.2.18.)(좌), 이정수의 장례식 『조선일보』 (1929.2.21)(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