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서 답을 찾다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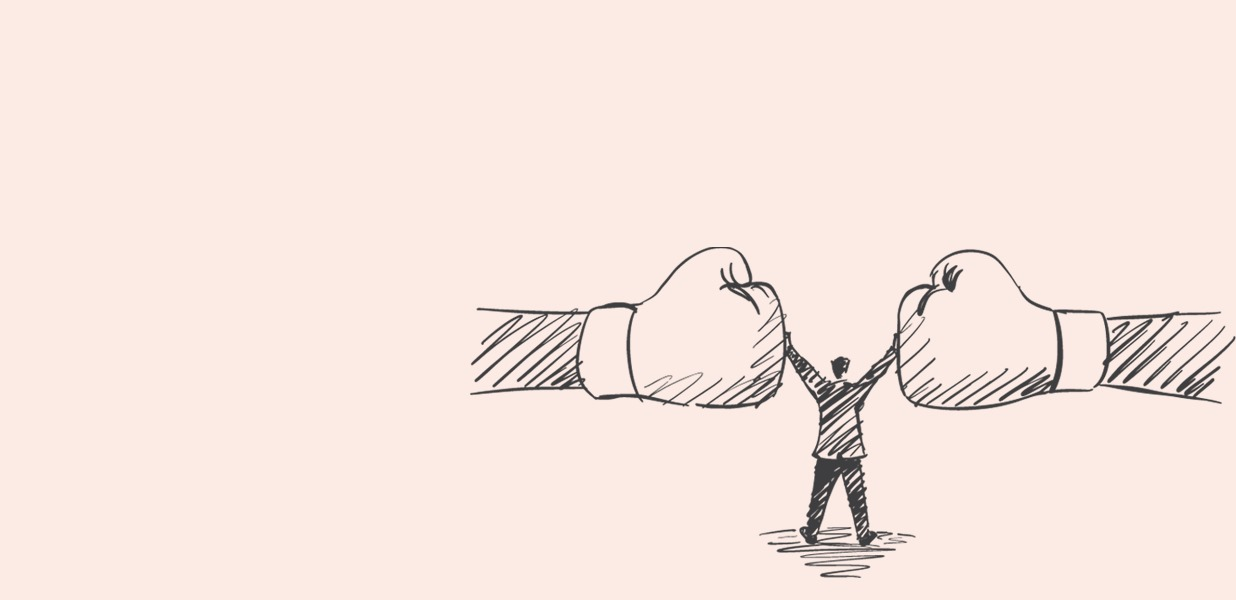
글 이성주 역사칼럼니스트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신채호는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중 한 사람이다.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라는 걸출한 역사서를 냈고, 독립운동 현장에서 조선의 광복을 위해 싸워왔던 행동하는 지식인, 단재(丹齋) 신채호. 비록 땅은 빼앗겼으나 우리의 민족적 의식만은 뺏기지 않겠노라 외쳤던 그는 ‘역사’라는 칼을 뽑아들고 일제와 맞서 싸운 ‘한민족 혼’의 수호자였다.
우리 민족의 혼을 지켜낸 56년
▲<황성신문> 기자 활동 ▲1906년 <대한매일신보> 주필 ▲1907년 신민회 가입 ▲19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참여 ▲1928년 타이완 지륭(基隆)에서 체포, 다롄(大連) 뤼순감옥에서 수감 ▲1936년 옥중에서 뇌일혈로 별세
신채호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해인 1905년 성균관 박사가 되면서 국가로부터 총명함을 인정받았으나, 주권을 잃은 국가가 일제의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자 곧바로 민족운동에 뛰어들었다. 다음은 신채호가 쓴 『역사와 애국심과의 관계』에서 발췌한 문장이다.
‘오호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천만 동포의 귀에 애국이란 단어가 못이 박히도록 할까? 오직 역사로써 해야 할 것이다.’
다른 독립운동가들이 총칼을 통한 무력투쟁 혹은 교육으로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결심했을 때, 신채호는 다소 생소하게도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독립을 찾으려 했다.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된 ‘독사신론(讀史新論)’은 당시 식민사관을 비판하고 주체적인 민족주의 사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민족이 신채호에게 큰 빚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이전까지는 일본의 역사서를 번역하기 바빴던 것이 우리 역사학의 한계였는데, 그는 단군조선-부여-고구려로 이어지는 민족사관의 기틀을 다졌다. 일본의 억지주장인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과 같은 망언을 여지없이 논파해 버린 것은 물론, 근대사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채호는 1135년 서경천도운동을 주장한 묘청을 자주적인 역사관을 가졌던 인물이라 평가하고,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을 사대주의자로 정의내린 바 있다. 또한 ‘천하는 일정한 주인이 따로 없다’는 천하공물설(天下公物說)과 ‘누구라도 임금으로 섬길 수 있다’는 하사비군론(何事非君論)을 내세웠던 조선 전기의 사상가 정여립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은, 그의 민족주의적 사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신채호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 바로 『조선상고사』다. 이 책은 그가 옥중에 있을 때 쓴 『조선사연구초(朝鮮史硏究草)』를 근간으로 한 저작이다.
이처럼 신채호는 독립운동의 방법론으로 ‘역사’를 선택했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일제에 맞섰다.
*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
일본의 야마토정권이 4세기 후반 한반도 남부지역에 진출해 백제·신라·가야를 지배하고, 가야에는 일본부(日本府)라는 기관을 두어 통치했다는 주장. 일본의 한국사 왜곡 사례 중 하나.
오롯이 ‘내’가 중심인 나의 삶, 나의 역사를 지키는 일
‘역사는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
『조선상고사』 첫머리에 적혀 있는 이 문구는 아주 유명한 말인데, 풀이하자면 ‘역사란 나와 나 아닌 것의 투쟁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란 나 자신을 포함한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을 의미하고, ‘나 아닌 것’은 말 그대로 나와 대칭되는 존재들을 뜻한다.
여기서 생각해 봐야할 부분이 있는데 ‘내 안에도 나와 내가 아닌 것이 있고, 나 아닌 것에도 나와 내가 아닌 것이 있다’는 점이다.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말해, 역사의 주체가 되는 나와 내가 아닌 것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뜻이다.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이 말은 신채호의 자주적 민족사관을 압축하여 보여준다.
또한 이것은 우리 삶의 기준을 규정하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삶은 그 자체로 역사다. 즉, 우리는 지금 저마다 각각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역사를 쓰는 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점은 무엇일까? 바로 주체가 되는 ‘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나의 지난 과거, 내가 살아온 방식, 나만의 삶의 철학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떠올려 보자. 우리는 대개 주변의 말이나 TV 혹은 인터넷에서 떠드는 말들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정보를 얻는 것은 좋다. 그러나 ‘생각’을 빌려온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가?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그저 남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보자. ‘나’와 ‘내가 아닌 것’이 모호해진 요즘, 신채호의 시선으로 보자면 우리는 나와 내가 아닌 것의 싸움에서 지고 있고, 곧 내 역사를 빼앗기고 있다.
나의 삶, 우리의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그 중심이 되는 나와 우리의 정립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 나를 잃어버린 채 ‘내가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휘둘린다면 나 없는 내 역사, 내가 아닌 나의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이 우리 국권을 강탈한 뒤 제일 먼저 했던 것 중 하나가 우리의 역사와 민족혼의 말살이었다. 크게 보면 한 국가의 역사와 민족성을 없애는 것이지만, 작게 보면 개개인의 역사와 개성을 말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역사와 개성을 빼앗기고 있는 중은 아닐까?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내면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나’를 증명하고 찾는 일. 그것이 내 삶의 역사를 쓰는 첫걸음이란 걸 잊지 말자.
이성주
시나리오 작가 겸 역사칼럼니스트.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글쓰기를 목표로 『조선의 민낯』, 『왕들의 부부싸움』과 같은 역사서를 출간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제정치와 관련된 연구 및 집필에 열중하고 있다. 『전쟁으로 보는 국제정치』 시리즈 1, 2, 3권을 출간 중이다.

